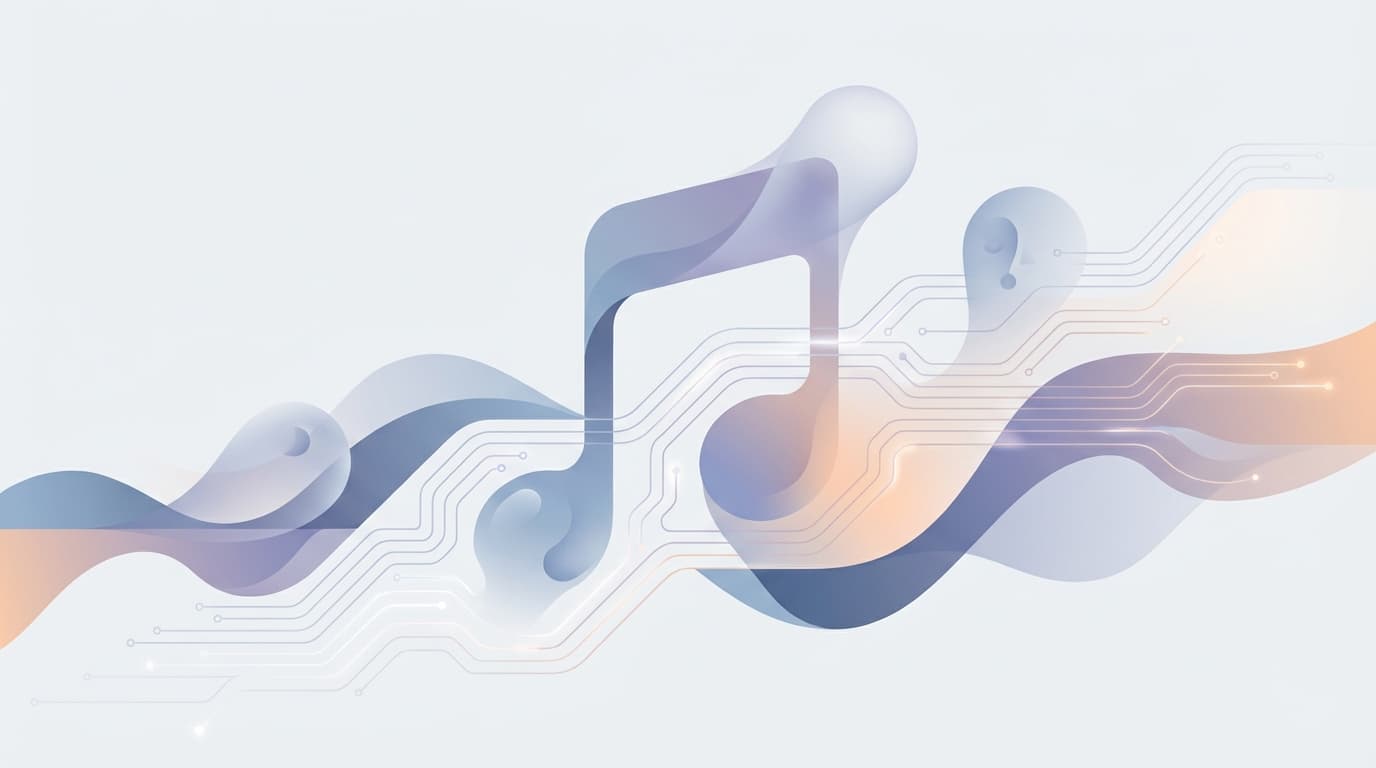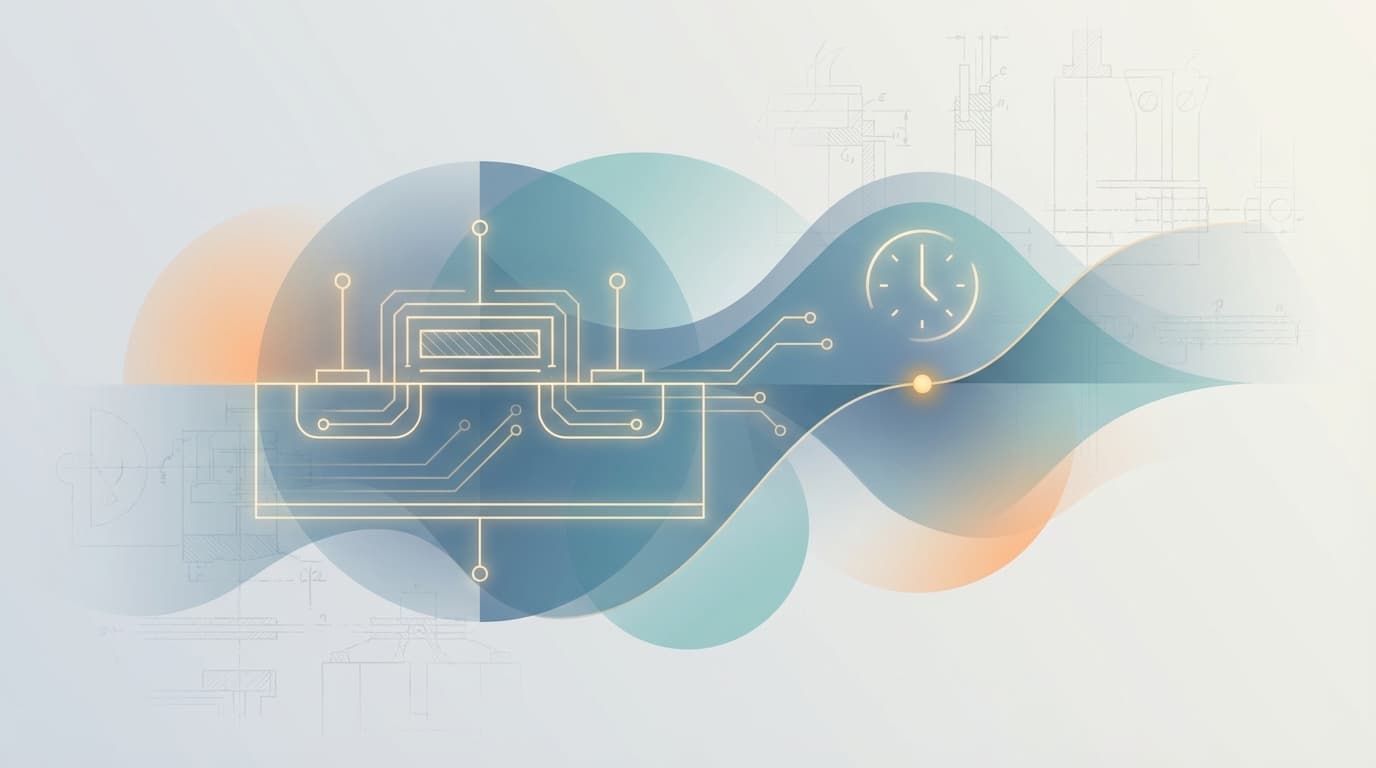
잊혀진 1925년의 특허와 기술의 '적기(Timing)'에 대하여
1925년 줄리어스 에드가 릴리엔펠트가 고안한 FET 특허 사례를 통해, 당장의 성과보다 본질적인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시점(Timing)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고찰합니다.
송찬영
CTO

안녕하세요. 풀링포레스트 CTO 송찬영입니다.
최근 흥미로운 기술 아티클 하나를 접하고 꽤나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트랜지스터를 누가 발명했는가?"에 대한 위르겐 슈미트후버(Jürgen Schmidhuber)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공대 학부 시절부터 '트랜지스터의 아버지'는 벨 연구소(Bell Labs)의 쇼클리, 바딘, 브래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1948년에 개발한 점접촉 트랜지스터(Point-contact transistor)가 전자 혁명의 시발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1925년, 즉 벨 연구소의 발표보다 무려 23년이나 앞서 줄리어스 에드가 릴리엔펠트(Julius Edgar Lilienfeld)라는 물리학자가 이미 전계효과 트랜지스터(FET)의 특허를 출원했더군요.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데이터센터의 GPU에 들어가는 수조 개의 트랜지스터는 벨 연구소의 방식이 아니라, 릴리엔펠트가 고안한 FET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벨 연구소의 방식은 기술적으로는 '막다른 길(Dead end)'이었고, 결국 역사는 릴리엔펠트의 설계로 회귀한 셈입니다.
이 사실이 주는 충격은 단순히 "교과서가 틀렸다"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엔지니어링의 본질과 '시점(Timing)'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릴리엔펠트의 아이디어는 완벽했지만, 당시의 재료 공학 수준이 그의 설계를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고순도 반도체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실험실 밖으로 나오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죠. 반면 벨 연구소는 당장 구현 가능한, 하지만 덜 우아한 방식(점접촉)으로 먼저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고 기술적 부채가 쌓이자, 인류는 다시 가장 본질적이고 이론적으로 탄탄했던 릴리엔펠트의 FET로 돌아왔습니다.
풀링포레스트에서 AI 프로덕트를 개발하면서 우리 팀도 매일 비슷한 갈림길에 섭니다. 당장 눈앞의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레거시 코드 위에 덕지덕지 패치를 붙일 것인가(마치 점접촉 트랜지스터처럼),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설계할 것인가(FET처럼)에 대한 고민입니다.
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해 때로는 빠른 구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리더로서 저는 팀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지금의 구현이 '우회로'인지 '고속도로'인지는 알고 가자"고 말이죠. 벨 연구소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훗날 자신들의 방식이 기술 발전을 오히려 지연시켰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장의 성과에 취해 본질적인 설계를 외면하면, 결국 후대(혹은 미래의 우리)가 그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LLM 기반의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랭체인(LangChain) 같은 도구로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 기술의 근간이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도구를 잘 쓰는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릴리엔펠트처럼 수십 년 뒤에도 유효할 '원리'를 이해하는 엔지니어가 되어야 합니다.
슈미트후버 교수의 글은 1941년 콘라드 추제의 Z3 컴퓨터부터 시작해, 무어의 법칙보다 훨씬 오래된 컴퓨팅 비용의 하락 법칙, 그리고 물리적 한계(Bremermann limit)까지 언급하며 기술의 거대한 흐름을 조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라는 물리적 실체 위에서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작성한 커밋(Commit)이 당장의 버그를 잡는 임시방편인지, 아니면 10년 뒤에도 유효할 견고한 설계인지 한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 속에서 잊혀졌지만 결국 승리한 릴리엔펠트의 FET처럼, 본질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있나요?